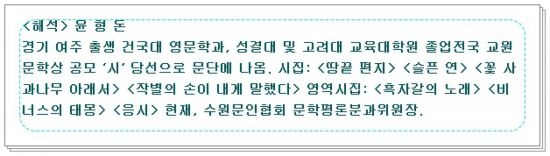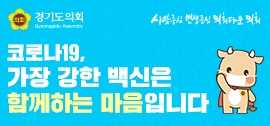밝덩굴/ 늙은이의 말들
여보게,
자네 걸음걸이가
왜 그런가?
이 사람
오늘 일은
오늘에 감사한다네
그러엄
올제의
칠보산 노을에도
무지개는 뜰 걸세
밝덩굴(1939~)
한글이름 짓기 회장을 역임했고 첫 시조집 ‘달 그림자’, 수필집 ‘잃어버린 달’, ‘백령도를 한 번 가 보세요, 마음이 울적할 땐’등을 펴냈다. 본명은 박병찬. 5남매 이름을 모두 한글로 지을 정도로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 학자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들 이름을 ‘박차고나온노미새미나’라는 열자 성명으로 지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원여고, 성포중학교장 등 교단에서 평생 외길을 걸어오면서 시수필집, 가족문집, 언어집, 희곡집 등을 총망라한 밝덩굴 전집을 남겼으며 녹조근정훈장과 수원문학대상, 경기문학인상, 경기예술(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시읽기/ 윤형돈
첫 시조집 ‘달 그림자’를 기리는 축시를 지어 시인께 낭독해 드린 적이 있다 ‘이름만 들어봐도’란 제목인데, 나를 통과하는 상념이 다소 투박하지만 그냥 뻗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고향 마을 초가지붕에 박덩이 달덩이 된 사람이여,
넝쿨째 주렁주렁 복덩이 자손들과
한글 자모의 아버지 밝덩굴님은
‘박차고나온노미새미나‘를 낳은 분이외다.
이름만 들어봐도 신묘막측한 박을 타서
넉넉한 인심 노나 주고 조롱박 표주박 만들어
건조한 목울대를 축여 주시던 분,
달그림자 드리운 대전 발 0시 50분의 늙은 기억이
지금쯤 광교산 기슭에 내려
막걸리의 신산한 저녁을 음미하고 계시리라.
그것은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옛날 보내주신 엽서를 발견하고 아득한 기분에 젖는 回憶의 감정과 겹친다. 그때는 이미 ‘이즈음, 문득 보고 싶은 고운 손‘이나, ‘부뚤 어머니의 사과‘란 수필 제목 자체에 매료되던 때였다. 엽서의 내용인 즉 다음과 같이 촌지에 가깝다
“윤형돈 시인께
시집 ‘슬픈 연’ 출산을 축하합니다. 좋은 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밝덩굴 드림“
모교인 ‘건국대학교’ 마크가 선명한 관제엽서에 보내 주신 선배님의 까마득한 글귀 뒷면에는 학교 상징인 일감호수 사진이 있고, 잔디 캠퍼스엔 박목월의 ‘황소예찬’ 동상 시가 걸려 있다. 그때는 학교 축산농장에서 가공한 건국우유에 밥 말아 먹으며 문리대 영문과 캠퍼스를 하릴없이 소요하던 시절이었다. 슬플 때는 물속에 가라앉은 두레박의 느낌이요, 기쁠 때는 가울 무가 파란 빛을 띠고 땅위로 솟아오른 느낌과 같이 청초한 분이었다고 할까
미상불, 늙음은 자연의 철리요 순환이다 욕망이란 전차를 타고 질주하는 젊음도 언젠가는 쇠망과 쇄락의 길에 이른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가시면류관의 인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구러 이제 그 분의 세월도 많이 흘러서 ‘늙은이의 말’이 절로 누설될 때가 되었다. 외양과 말투와 걸음걸이가 예전만 못해 저들끼리의 민망한 늙음이 서로에게 자신의 거울로 투영되어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기에 생의 한 모퉁이에서 때론 득의에 찬 결기로 ‘오늘 일은 오늘에 감사한다네.‘ 읊조리듯 자위하면서 그렇게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 ’올제(내일)의 칠보산 노을에도 무지개는‘ 뜨고, 해지기 전 붉은 노을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찾아올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