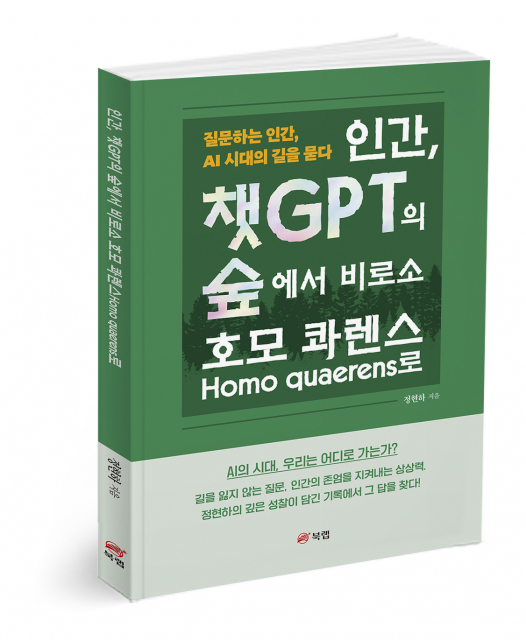북랩이 최근의 거대한 인공지능(AI) 혁명 속에서 인간이 다시 ‘질문하는 존재’로 서야 함을 선언하는 인문 다큐멘터리 형태를 빌린 소설 ‘인간, 챗GPT의 숲에서 비로소 호모 콰렌스(Homo quaerens)로’를 출간했다.
▲ ‘인간, 챗GPT의 숲에서 비로소 호모 콰렌스(Homo quaerens)로’, 정현하 지음, 144쪽, 1만6700원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질문과 개인의 사유는 그보다 더 정교해져야 한다
책은 기술을 찬양하지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대신 기술을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책임의 깊이를 비추는 거울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문명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거대한 AI 혁명 속에서 인간은 다시 ‘명확히 질문하는 존재’로 서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저자의 목소리는 명료하다. 저자는 “AI의 답은 점점 더 정확해지지만, 인간의 질문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 모호함 속에 인간다움이 있다”고 말한다.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챗GPT가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다. 또한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주권’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2016년 캐나다의 작은 연구실. 소설 속 주인공 ‘나’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오픈AI의 출발 현장에 함께하게 된다.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언급된 시작점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AI의 진화 궤적을 오픈AI의 창립과 GPT의 발전, 그리고 샘 올트먼의 해임과 복귀 등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등장시켜 AI 역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 형태로 생생하게 다뤘다.
이야기는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알렉스넷으로 대표되는 딥러닝 혁명에서 GPT의 등장까지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켰는지를 탐색한다. 2장은 오픈AI의 내부 갈등과 권력의 역학, 그리고 샘 올트먼 사태로 상징되는 AI 기업의 이면을 다룬다. 3장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콰렌스(Homo quaerens), 질문하는 인간’으로의 진화를 제안하며 AI 시대에 인간이 지녀야 할 새로운 정체성을 성찰한다. 인간이 기술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술이 인간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또한 기술의 진보가 단순한 코드의 문제를 넘어 AI 기업의 혁명과 위협과 인간의 가치와 권력 구조까지 뒤흔드는 일대 사건임을 저자는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인간, 챗GPT의 숲에서 비로소 호모 콰렌스로’는 ‘AI의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문이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사유를 멈춘다’고 말한다. 이 책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이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문장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