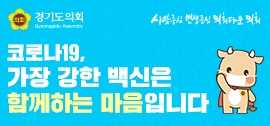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그러나 장애인의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살기를 원한다. 장애인은 누구인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설은 많지 않다. 장애인 학교나 시설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집 앞에는 안 돼!”라는 논리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신설해 달라면 무릎까지 꿇은 어머니들은 결국 “우리 집 앞에는 안 돼!”라는 말에 성북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 앞에는 안 돼!”라는 시설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쓰레기장, 장례식장, 재처리 가공 시설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혐오시설로 취급된다. 실제로도 공해유발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이런 시설들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악취나 공해시설이 아니고 환자를 돌보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시설이 정신의료기관이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폐쇄병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오산에서 정신과 병원의 세교신도시 진입을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도 정신병원이 외곽으로 나갈 이유는 없는데도 말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지나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정신병도 늘어만 가고 있다. 정신과 진료는 우울증에서부터 수면부족까지 수백까지 분야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입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 회사문제, 가족관계 등으로 상처받는 사람들까지 가까운 곳에서 정신과 진료 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직까지 불치병에 속하는 치매환자에게 가까운 정신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역일수록 아픈 사람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운 병원만큼 소중한 곳도 없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것이 혹 정신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또 정신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폐쇄병동은 그저 입원실이다. 폐쇄병동 운영은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라는 논리에 병원개원이 어렵다는 것에 씁쓸하고 또 유감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정신과 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려 2년간이나 길고 지루한 행정소송 끝에 병원이 이겼다. 대법원은 소송의 마지막에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라고 결말지으면서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그럼 당신 집 앞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도 좋으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만 달리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다.
집단 거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해주고, 가족 중에 누구인가 치매나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진료를 받기 위해 아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복리 시설을 굳이 혐오시설로 만들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